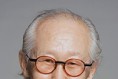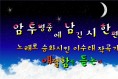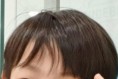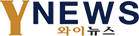동남문화관광연구소 소장 관광경영학 박사 심 상 도

1. 석당 최남주 선생의 복원 이야기
경주 원원사지 동서석탑 복원 이야기는 와이뉴스 화요칼럼 “열박산 김유신 기도장에 대한 최남주 선생과 양주동 박사 논쟁”(2024년 5월 15일 자)에서 석당 최남주 선생의 경주 문화 지킴이로 일관한 일생과 업적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였으므로 참고하기 바란다. 이번에는 최남주 선생이 쓴 “원원사지 동서석탑 복원 이야기”를 아래와 같이 소개하기로 한다(한국박물관학회, 『박물관학보』, no. 12, 13, 2007년, pp.122-123).
필자(최남주)가 경주 주변의 신라 석탑에 뜻을 두고 답사를 시작한 것은 1929년도부터라고 생각된다. 전해오는 문헌사료 중에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를 기본으로 하고 동경지(東京誌)와 동경잡기(東京雜記), 그리고 동국여지승람 등 지역의 지리지를 참고하여 직접 현장답사를 통하여 절터와 불상 그리고 석탑이 잔존하는지를 확인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그런데 이러한 작업은 조선총독부발물관 경주분관에서 경비를 책정하여 주관하는 사업이 아니었고 경주고적보존회의 예산으로 시작된 것이다. 내가 처음 원원사지를 답사하였을 때 이용한 차편은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경주-울산 간 경변철도였다. 원원사지의 위치는 외동면 모화역에서 하차 후 도보로 약 40분 정도의 거리의 봉서산(鳳棲山) 기슭에 자리 잡고 있었다. 본 사지는 이미 조선조 말기에 법등이 꺼져 폐사지가 된 상태이다.
내가 사지에 도착 후, 신라통일기에 제작된 돌계단을 따라 금당지에 올라서니 우거진 잡초 속에 도괴된 통일신라시대 석탑 2기가 보였다. 내가 그동안 경주일대의 여러 신라석탑들을 답사해 보았지만 석탑기단면석에 문관(文官服)을 장식한 십이지신상을 조각해 놓은 것은 원원사지석탑에서 처음 보았다. 물론 김유신 장군 묘를 비롯하여 다른 몇몇의 능묘에는 십이지신상을 조각해 놓은 사례가 있다.
원원사의 1층 탑신에 조각된 사천왕상은 마치 살아있는 듯한 역동감이 넘쳐흘렀다. 마치 석굴암의 금강역사상 조각과 비슷한 양감(量感)을 나타내었다. 금당지의 초석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고 금당 앞 석등 부재(部材)도 완벽하였다.
삼국유사 권제5 명랑신인조(明郞神)에 의하면 원원사지는 경주 동남쪽 20여리에 있으며 신라시대 김유신(金庾信), 김술종(金), 김의원(金義元) 등이 발원하여 세워진 사찰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신라가 삼국통일을 한 이후 호국사찰의 성격이 강한 곳이라 할 수 있다.
호국사찰로 추정되는 사실은 원원사지 금당지 앞에서 남쪽으로 탁 트인 곳에 신라의 천리장성인 관문성(關門)이 자리 잡고 있기에 더욱 뒷받침해 주고 있다. 따라서 왜구들의 침략을 방어하기 위해 울산 남쪽 해안에 축조한 성책이 원원사지에서 한눈에 들어온다.
삼국통일과 대당(大唐)전쟁을 수행한 신라의 김유신 장군과 김술종, 김의원 장군은 이제 남쪽으로부터 왜구들의 침공을 격퇴하기 위해 관문성이 보이는 봉서산 깊숙한 곳에 간절히 나라를 지키는 호국불교의 원력으로 원원사를 건립한 것으로 생각된다.
필자(최남주)는 유서 깊은 원원사지답사 이후 본 사지의 동·서탑이 무너져있는 상태를 안타깝게 생각하여 모로가(諸鹿央雄) 경주박물관 관장에게 이를 복원하는 것이 좋겠다고 보고를 하였다. 모로가 관장은 나의 의견에 동의를 하고 즉시 서울의 조선총독부 박물관의 주임인 후지다 료사쿠 박사에게 석탑을 복원할 수 있는 건축기사 파견을 요청하였다.
이때 총독부박물관 촉탁으로 근무하던 후지시마(藤島亥次郎)를 추천하여 파견해주었다. 후지시마 박사는 동경제대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당시 조선건축사에 매료되어 총독부박물관 촉탁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그 후에는 조선의 여러 건축물과 사지, 석탑 등을 답사 실측하여 조선건축사론(朝鮮建築史論)을 저술하기도 하였다.
1932년 봄, 필자도 참여하고 후지시마 박사의 설계와 시공 책임하에 원원사지 동·서탑의 복원이 시작되어 약 한 달 만에 작업이 마무리되었다. 여기에 소요된 경비 전액은 경주고적보존회에서 담당하였다. 당시 경주고적보존회 사업시행령에 의하면 문화재보존상 보수가 필요할 경우에 그 설계는 조선총독부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였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원원사지 석탑복원사업이 우리나라 최초로 조직된 민간문화재 보호단체에서 시행한 최초의 석탑복원사업이라고 생각된다. 이는 그만큼 당시 경주군민들의 문화재에 대한 사랑의 열기가 넘쳐났기 때문이다.
필자는 1971년 원원사지 동쪽 800m 지점 봉서산(鳳棲山) 계곡에서 신라시대 신인종(神)의 대성(大聖)인 안혜대사(安惠大師)의 유골을 봉안한 것으로 추정되는 석종 양식의 부도 1기를 발견하였다. 이 부도는 높이가 1.3m 그리고 둘레가 2.84m의 석종형식으로 복연 꽃판 위에 2층 기단이 축조되어있어 총 높이는 2.26m이다.
부도의 특이한 점은 기단면석에 보상화문(寶相花文)과 함께 범어梵語)로 “옴, 치, 림”이란 금석문이 조각되어 있다. “옴, 치, 림”은 진언종(眞言宗)과 신인종에서 호신(護身)이란 뜻이다. 이러한 범어 금석문이 신라시대 석종 형태의 부도에 조각된 것은 원원사지 부도가 최초라고 생각된다.
삼국유사에 의하면 안혜대사의 유골이 원원사 뒤쪽에 봉안되어 있다고 기록되어 있어, 이 부도의 주인공이 안혜대사라는 사실을 더욱 뒷받침해주고 있다. 각설하고 필자의 원원사에 대한 애정은 어느 신라유적 보다 각별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번 부도 발견이 계기가 되어 법등이 꺼진 원원사가 다시 복원되어 그 옛날호국불교의 도장으로 옛 모습을 찾았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세월이 흘러 1973년 어느 화창한 봄날 나는 경주박물관에서 해방이후 경주를 처음 찾은 후지시마(藤島亥次郎) 박사와 50년 만에 재회를 하였고, 원원사지석탑 복원작업을 회상하는 정담을 나누었다. 원원사 석탑복원 당시 필자와 후지시마 박사는 원원사지에서 2km 떨어진 민가에서 방을 빌려 숙식을 해결하였다. 그래서 후지시마 박사도 한국의 시골생활에 대한 좋은 추억거리를 만들었다고 나에게 들려주었다.
석탑보수 작업에 동원된 인원은 경주지역의 목수와 일본인 거중기 기사, 그리고 민간인 등 10여 명이 동원된 것으로 기억된다. 아무쪼록 앞으로 원원사지 동서석탑이 한국 미술사를 연구하는 후학들과 이곳을 참배하는 순례자들에게 경주사람들의 자발적인 문화재에 대한 사랑과 정성으로 복원되었다는 사실을 증언하고자 이글을 남기는 바이다.
1932년에 와서 재단법인 경주고적보존회는 경주지역의 중요 문화재와 사적지에 표지석과 안내판을 세워 문화재의 중요성을 일반인들에게 알린 사실 또한 유적을 사랑하는 민간단체의 자랑거리가 아닐 수 없다.
2. 심상도의 서부도 답사
필자(심상도)는 경주 원원사지를 2024년 3월 23일, 3월 30일 두 차레에 걸쳐 답사하였다. 3월 23일에 답사할 때는 경주시 외동읍 녹동리 관문성, 녹동리 쇠부리터, 외동읍 모화리 쇠부리터를 먼저 답사한 다음 오후 늦게 원원사지를 방문하였다. 원원사지 동서석탑, 석등, 원원사지 경내를 자세히 둘러보다가 저녁이 되어 어두워지고 있었다. 서부도탑을 답사하기 위하여 신우대 숲을 지나 작은 계곡을 건너갔지만 안내 표지판이 없어 찾지 못했다.
서부도와 동부도를 다시 답사하기 위해 3월 30일에 원원사지를 두 번째 방문하였다. 용왕각 앞으로 난 오솔길을 따라 신우대 숲을 지나 계곡을 건너 서부도를 찾기 위해 산 위쪽으로 올라갔다. 사람들이 오간 희미한 등산로가 보여 산 위로 올라갔지만 부도탑은 보이지 않았다. 올라온 코스로 다시 힘들게 내려갔다. 다시 내려와서 작은 계곡을 건너 서쪽으로 무작정 걸어가면서 주변을 주의깊게 살펴보았다.
사람들이 오가면서 돌을 밟고 지나간 흔적이 어렴풋이 보여 계속 앞으로 나가니 갑자기 눈앞에 커다란 부도탑이 나타나 너무나 기뻤다. 이 부도는 2층으로 된 기단부부터 상륜부까지 멋지게 장식되어 매우 아름답다. 부도탑의 크기와 중요성은 앞의 글에서 최남주 선생이 자세히 설명하였다. 원원사지에 남아 있는 4기의 부도탑 중에서 가장 정성들여 만든 부도이다.
최남주 선생은 기단면석에 범어(梵語)로 보상화문(寶相花文)과 함께 범어梵語)로 “옴, 치, 림”이란 금석문이 조각되어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옴, 치, 림”은 진언종(眞言宗)과 신인종에서 호신(護身)이란 뜻이라고 하였다. 『삼국유사』의 기록을 근거로 신인종의 안혜대사(安惠大師) 부도탑으로 추정하였다.
명랑(明朗)은 신라 왕족으로 나당전쟁기에 밀교 경전인 『관정경(灌頂經)』과 『금광명경(金光明經)』에 따른 문두루비밀법(文豆婁秘密法)을 설행하여 당나라 군사를 격퇴했던 밀교의 승려로, 신인종(神印宗)의 종조이다. 명랑의 뒤를 이은 신인종의 고승으로 안혜(安惠) · 낭융(朗融) · 광학(廣學) · 대연(大綠) 등 사대덕(四大德)이 있다(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경주의 원원사(遠願寺)는 이 4명의 대덕과 관련이 있다.
3. 심상도의 동부도 3기 답사
최남주 선생은 원원사지 동부도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필자는 원원사지 동쪽에 있는 동부도를 찾아서 원원사지 동서석탑 뒤에 있는 오솔길을 따라 답사에 나섰다. 안내표지판이 없어 대강 짐작으로 부도탑을 찾기 위해 걸어갔다. 축대를 쌓은 수목원이 나타났는데, 나무 이름은 알 수 없었다. 밑으로 계속 내려가다 보니 논처럼 보이는 습지가 있었는데, 석조가 보였다. 인터넷으로 사전 조사했기 때문에 알 수 있었다.
부도를 찾기 위해 밑으로 가니 계곡이 있었고, 계곡을 건너편에 임도가 보였다. 매우 위험한 곳으로 길이 없어 간신히 계곡을 건너 임도로 올라갔다. 임도는 삼태봉(4.3km)으로 올라가는 등산로였다. 조금 올라가니 태극기가 걸려있는 작은 암자가 보였다. 임도를 올라가 왼쪽으로 접어드니 허름한 임시 건물로 지은 슬레이트 지붕의 봉연암이 나타났다. 태극기가 암자에 걸려 있었다.
원원사지 동쪽 계곡을 따라 800m쯤 간 곳에 있는 3기의 부도가 있다. 부도는 모두 석종형으로 왼쪽 부도와 가운데 부도는 자연 암반을 지대석으로 삼아 조성하였다. 오른쪽 부도는 세 부도 중 가장 아름답게 만들었다.
왼쪽과 가운데 부도는 대석이 하나인데 왼쪽 것은 무늬가 없고 가운데 것은 연꽃잎이 새겨져 있다. 가운데 부도는 다른 두 부도와는 달리 보주 부분이 없다. 오른쪽 부도는 탑신 윗부분에 복련을 새기고 꽃무늬를 조각했다. 대좌는 한 개이지만, 2층 기단을 하대석처럼 깎아 상·하대석을 갖춘 것처럼 조성했다.
동부도를 3기를 답사 후 돌아올 때는 원원사지 동서석탑 쪽으로 원점회귀 하기 위해서 임도로 내려가지 않고, 작은 계곡을 건너갔다. 숲을 헤치며 길을 찾아 동서석탑 쪽으로 되돌아 올 수 있었다. 가장 쉬운 답사 방법은 원원사지 입구로 내려가서 임도를 따라 올라가 봉연암을 찾아가면 동부도를 만날 수 있다. 돌아올 때도 임도를 거쳐 원원사지로 돌아오면 된다. 임도 코스로 답사하면 석조를 볼 수 없다.
원원사지의 동서석탑 주변의 소나무는 재선충에 걸려 누렇게 변했는데, 국가유산청에서 빨리 제거하여 재선충의 확산을 방지해야 하겠다. 동부도와 서부도를 찾아갈 수 있는 안내 표지판이나 문화유산 해설판이 없어 찾는 데 애를 먹었다. 관광객에 대한 친절한 안내 서비스가 필요하다.
이번에 소개한 최남주 선생의 원원사지 동서석탑 복원 이야기는 박물관학회보에 나온 글을 인용하였다. 논문집을 보내준 최남주 선생의 자제인 최정표 교장 선생님(4남), 최정대 대표(5남)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속초17.4℃
속초17.4℃ 21.5℃
21.5℃ 철원21.6℃
철원21.6℃ 동두천22.3℃
동두천22.3℃ 파주21.3℃
파주21.3℃ 대관령10.9℃
대관령10.9℃ 춘천21.1℃
춘천21.1℃ 백령도16.4℃
백령도16.4℃ 북강릉15.8℃
북강릉15.8℃ 강릉18.1℃
강릉18.1℃ 동해16.3℃
동해16.3℃ 서울24.4℃
서울24.4℃ 인천22.7℃
인천22.7℃ 원주22.5℃
원주22.5℃ 울릉도15.0℃
울릉도15.0℃ 수원22.0℃
수원22.0℃ 영월18.9℃
영월18.9℃ 충주22.7℃
충주22.7℃ 서산22.4℃
서산22.4℃ 울진16.4℃
울진16.4℃ 청주24.8℃
청주24.8℃ 대전22.8℃
대전22.8℃ 추풍령19.2℃
추풍령19.2℃ 안동19.0℃
안동19.0℃ 상주21.2℃
상주21.2℃ 포항18.1℃
포항18.1℃ 군산19.7℃
군산19.7℃ 대구18.8℃
대구18.8℃ 전주19.5℃
전주19.5℃ 울산16.7℃
울산16.7℃ 창원17.8℃
창원17.8℃ 광주22.0℃
광주22.0℃ 부산17.7℃
부산17.7℃ 통영17.6℃
통영17.6℃ 목포20.7℃
목포20.7℃ 여수18.6℃
여수18.6℃ 흑산도17.3℃
흑산도17.3℃ 완도17.8℃
완도17.8℃ 고창19.8℃
고창19.8℃ 순천17.4℃
순천17.4℃ 홍성(예)22.9℃
홍성(예)22.9℃ 21.2℃
21.2℃ 제주21.2℃
제주21.2℃ 고산19.1℃
고산19.1℃ 성산19.6℃
성산19.6℃ 서귀포20.4℃
서귀포20.4℃ 진주18.5℃
진주18.5℃ 강화22.1℃
강화22.1℃ 양평23.1℃
양평23.1℃ 이천22.4℃
이천22.4℃ 인제18.0℃
인제18.0℃ 홍천21.2℃
홍천21.2℃ 태백12.5℃
태백12.5℃ 정선군16.1℃
정선군16.1℃ 제천19.4℃
제천19.4℃ 보은19.5℃
보은19.5℃ 천안20.7℃
천안20.7℃ 보령18.5℃
보령18.5℃ 부여22.2℃
부여22.2℃ 금산20.3℃
금산20.3℃ 22.1℃
22.1℃ 부안19.9℃
부안19.9℃ 임실18.7℃
임실18.7℃ 정읍20.3℃
정읍20.3℃ 남원18.9℃
남원18.9℃ 장수16.1℃
장수16.1℃ 고창군18.7℃
고창군18.7℃ 영광군19.2℃
영광군19.2℃ 김해시17.9℃
김해시17.9℃ 순창군18.7℃
순창군18.7℃ 북창원19.3℃
북창원19.3℃ 양산시19.3℃
양산시19.3℃ 보성군20.0℃
보성군20.0℃ 강진군20.3℃
강진군20.3℃ 장흥19.2℃
장흥19.2℃ 해남18.9℃
해남18.9℃ 고흥19.3℃
고흥19.3℃ 의령군19.2℃
의령군19.2℃ 함양군19.6℃
함양군19.6℃ 광양시19.0℃
광양시19.0℃ 진도군18.5℃
진도군18.5℃ 봉화15.9℃
봉화15.9℃ 영주18.2℃
영주18.2℃ 문경20.2℃
문경20.2℃ 청송군16.8℃
청송군16.8℃ 영덕16.5℃
영덕16.5℃ 의성19.5℃
의성19.5℃ 구미20.7℃
구미20.7℃ 영천17.3℃
영천17.3℃ 경주시17.6℃
경주시17.6℃ 거창17.8℃
거창17.8℃ 합천19.8℃
합천19.8℃ 밀양20.7℃
밀양20.7℃ 산청18.2℃
산청18.2℃ 거제18.0℃
거제18.0℃ 남해17.4℃
남해17.4℃ 18.8℃
18.8℃